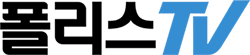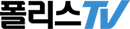대형(10대) 건설사들의 서울 신축 아파트 시장 싹쓸이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도심 내 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2만5838가구 중 10대 건설사가 지은 곳은 2만2451가구로 약 86.8%에 달했다.
지난 2019년 서울 분양 아파트 총 2만7642가구 중 10대 건설사의 몫은 2만372가구, 약 73.6%였다.
서울 전체 분양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분양은 오히려 늘었고, 비중도 1년 만에 13.2%포인트나 커진 것이다.
그나마 중견·중소건설사의 몫은 소규모 단지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중견·중소 건설사는 2년간 1만657가구를 분양했는데, 분양 단지 37곳 중 33곳이 500가구 이하의 소단지였다.
100가구 이하인 미니 단지도 16곳이나 됐다.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 기준 10대 건설사는삼성물산(래미안), 현대건설(힐스테이트·디에이치), 디엘이앤씨(e편한세상·아크로), 포스코건설(더샵), 대우건설(푸르지오·써밋), 현대엔지니어링(힐스테이트), 롯데건설(롯데캐슬·르엘), HDC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SK건설(SK뷰), 한화건설(포레나), 호반건설(베르디움·호반써밋)이다.
이들의 최대 강점은 고급 아파트 브랜드다.
재건축·재개발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 특성상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다.
최종 경합의 순간이 오면 결국 브랜드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지가 좋은 브랜드가 곧 수주의 원동력인 셈이다.
한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어떤 브랜드를 달았느냐에 따라 준공 이후 아파트값이 몇억원씩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아파트가 가장 큰 자산인 조합원 입장에서 결국 마감재나 설계 등 다른 조건보다도 아파트 이름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 분양시장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지난해 1만2032가구 규모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에 이어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308가구)을 따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흑석11구역(1509가구)를 수주한데 이어, 10일에는 동부건설과 컨소시엄으로 상계2구역(2200가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특히 올해부터 서울에서 눈에 띄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도 10대 건설사들이 독식할까 우려하고 있다.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군 건설사 브랜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SH나 LH 등의 브랜드를 내거는 경우가 많았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수주 1조원을 달성했지만 수도권 민영 주택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공공주택 수주였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은 최저가 입찰제로 경쟁률이 최대 300대 1까지 올라가는 상황이라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도 수주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군 건설사는 ‘래미안 원베일리’나 ‘서초 그랑자이’ 같은 랜드마크격 신축 아파트를 계속 짓고, 이를 광고판으로 활용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해나간다”면서 “반면 수주가 어려운 중견·중소 건설사는 신축 비중이 줄어 ‘노후화한 아파트 브랜드’로 도태되는 양극화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